명화(영화)를 만드는 조건


삶 속의 삶, 그 안에 있는 죽음 속의 죽음
- 8월의 크리스마스, 어떤 이의 죽음, 자꾸 내리는 비, 자꾸 뿌리는 은방울
주어진 낱말에 대해 설명하기 끝나면 돌리기 게임 칸에 표시 빙고 게임.
일곱 시를 알리는 환상 속의 알람을 듣고 일터 정문에 들어섰다.
'대체 저 여자는 무슨 중요한 일을 하길래 저렇게 일찍 출근하고 늘 가장 늦게 퇴근하는 것일까?"
나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생각에 미친 것은 며칠 전이다. 올해 새로 입사하신 본관 건물 경비 아저씨(? 할아버지. 아침 청소를 하실 때면 쓰신 채양이 드넓어서 전혀 연세를 추측할 수 없음)에게 내가 건네는 아침 인사는 지난해까지 계신 경비 할아버지에게 드리던 인사와 전혀 다를 바 없었다. 그분은 온 얼굴 가득 반가운 반응을 보이셨다. 본관 견물 앞 화단에서 꽃이며 날씨며 나누는 대화가 제법 긴 시간으로 이어지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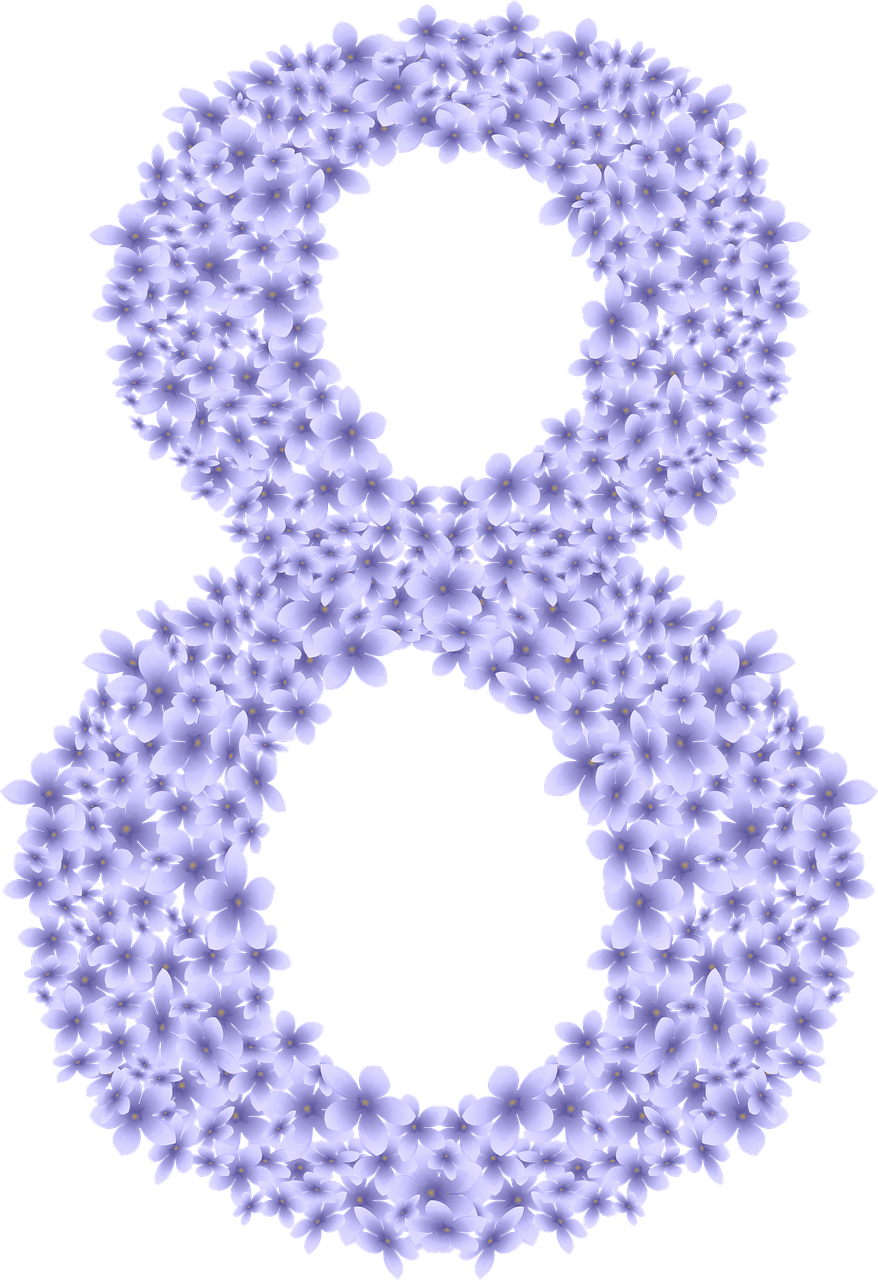

이번 경비 아저씨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 저런 것 모두 망라하여 빼낸, 대단히 건조한 문장의 답이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에 자주 노출되면서 내가 확실히 인지하게 된 것이 나의 출퇴근 시각에 대해 얼마나 한심스러워하실까 싶어 되도록 일곱 시를 넘어설 때에야 일터 정문을 넘는다는 것이다. (이런 속 좁은~)
어제 아침 본의 반, 타의 반의 반, 조직체의 뜻 반의 반에 의해 마음 다진 것을 어젯밤 이곳 일기에 고백하였다. 앞으로 며칠, 되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이곳 블로그 글을 쓰기에 담을 수밖에 없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를 오늘 실천하였다. 지금, 오후 아홉 시 사십오 분 즈음에야 이곳 문을 열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에 대해 내 개인적인 사고를 침투시켰던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 없다. 단 일 분 일 초도 인간 '나'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 점심도 으레 진행되는 절차에 의한 행위였다. 일터의 새 프로젝트 외에 한 일이 없다. 육신으로도, 정신으로도 아예 없다. 하여 오늘 일기를 쓸 거리가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이곳에 들어와 한 일이 글쓰기를 누르고는 그 아래 메뉴인 임시 저장을 열었다. 백 여 개 가깝게 담긴 창고에 이 창이 있었다. 글의 제목이 거하다. '명화(영화)를 만드는 조건'
'명화(영화)를 만드는 조건'
담긴 글의 요점은 이렇다. 저 위 맨 처음부터 하나, 둘, 세 줄까지의 문장이다. 요약하자면 영화에는 '액자 소설', 즉 '죽음'이라는 사건이 담긴 액자 영화일 때에 대체로 명화로 승격되더라는 결론을 미리 적은 글인 듯싶다. 아니라면 또 어쩌랴. 내가 임시 저장해 둔 내용은 제목 아래 단 세 줄의 문장이었다.
첫째, 둘째 줄의 문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셋째 문장이 궁금하다. 무슨 내용을 함축하는 문장일까.
'주어진 낱말에 대해 설명하기 끝나면 돌리기 게임 칸에 표시 빙고 게임'
아무리 뒤집고 또 뒤집고, 비틀고 또 비틀고, 읽고 또다시 읽어봐도 대체 왜 위 제목의 글에 빌붙어 있는 문장인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석할 수가 없다.

내가 글을 쓰면서 해 온 짓으로 봐서는 저 제목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저기 적어뒀을 리 없다. 무슨 연유로 적혀 있는 것인가. 십여 분을 추적하다가 그만 멈췄다. '주어진 낱말'과 '돌리기 게임'과 '빙고 게임'이라. 이 세 구절을 연결하는 저 위 제목에 연루된 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결론은 우선 '관련 없다'에 이르렀다. 이 시간 귀한 날에 내가 하고 있는 무의미한 이 짓이 대체 뭔가 하는 자기 성찰을 하면서 나를 반성한다. 각설하고.
명화(영화)를 만드는 조건
삶 속의 삶, 그 안에 있는 죽음 속의 죽음
- 8월의 크리스마스, 어떤 이의 죽음, 자꾸 내리는 비, 자꾸 뿌리는 은방울
결국 명화 속에는 삶이 큰 틀로 있고 그 속에 죽음이라는 액자가 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초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된다. 명화란 진정한 죽음이되 되도록이면 그 이유를 추적조차 할 수 없는 무고한 죽음이 꼭 영화 속 삶 안에 존재할 때에야 명화라는 것이다. '무고한'이라는 맹목적인 죽음을 이유를 달지 않고 진행시키는 영화가 명화라는 것.
어제 마저 본 영화 '2019년 리메이크된', 영화 '스타 이즈 본'에서도 그렇더라.
어미의 죽음 위에 아비와 자란 여자의 삶이 있다. 또 어미의 죽음을 딛고 자기 출생이 서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도 미리 죽었고 그자, 주인공 또한 또 한 죽음을 영화 속에 만들고 떠나는 남자가 있다. 죽음과 죽음과 죽음 위에 마침내 피어난 사랑의 영화. 영화 속 삶 속에는 꼭 액자소설처럼 죽음이 존재할 때에 명화가 된다라는 것. 내가 봐 온 영화들 대부분 그렇다. 꼭 죽음이 안고 있는 영화래야 그 영화를 시청하는 사람의 심장 중심을 득득 뜩뜩 긁더라는 것. 이름하여 명화라고 불리더라. 내가 적어도 서너 번씩은 보고 있는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더라. 안녕. 이곳 일기여 내일 만나자. 어쨌든 올게.
어서 아침 일기를, 아침 일곱 시 쯔음, 내 일터에서 적을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큼만 쓴다. 어쩌면 내일도 임시저장의 공간에서 글을 빼내 붙여쓰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다. 어서 씻고 잘 일이다. 내일 아침 일곱 시 이전에 출근을 위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 영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윗 프랑세즈 Suite francaise (20) | 2023.07.17 |
|---|---|
| 플로리다 The Florida Project (18) | 2023.07.10 |
| 1941 희생 : 아픈 기억 (18) | 2023.06.21 |
| 비스트 오브 노 네이션 Beasts of No Nation (15) | 2023.06.10 |
| 레즈 REDS (24) | 2023.06.06 |



